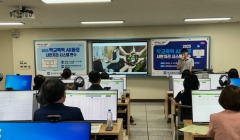편집 : newscheaner@kakao.com
교육부가 지난 2023년 6월에 발표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에 따라, 2025년부터 초·중·고교 수학, 영어, 정보, 국어 등 4개 과목에 AI 기반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8년까지 전면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 혁신'이라는 거창한 슬로건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의 우려가 깊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은 분명하다. 학습자의 수준과 이해도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 제공, 실시간 학습 분석을 통한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강화는 미래 교육의 중요한 요소다.
특히 농산어촌 및 교육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는 교육격차를 줄이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AI 활용 능력은 필수적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만을 말하기에는 그 이면의 그림자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학생들이 스스로 내용을 읽고 파악하는 문해력은 화면 중심의 교육 방식에서 오히려 저하될 가능성이 크고, 디지털 피로도와 몰입도 저하는 이미 온라인 학습 경험에서 입증된 문제다.
교사들 역시 기술 활용에 대한 부담과 함께, 학생별 AI 학습 관리를 위한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학부모들과 교육계, 특히 교원단체와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은 교육 현장에 충분한 준비와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무엇보다 현장의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교육부는 학교별 AI 교과서 채택을 2025년 한 해 동안 학부모의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으나, 현재 전국 학교의 AI 기반 학습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시범학교에서 채택률이 30%에 머물고 있으며, 향후 실제 채택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던 AI 교과서가 오히려 기술인프라의 차이에 따라 새로운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성장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공공 가치의 실현 과정이다. 기술 도입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그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현장과의 소통, 실질적인 준비, 그리고 단계적이고 창의력 증진에 중점을 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마다 디지털 여건이 다르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사 역량 역시 제각각인데,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추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분명 미래 교육의 한 방향일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완성도, 정책보다 공감이다.
정부는 일방적 추진을 멈추고,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도입해 나가야 한다.
뉴스채널 newscheaner@kakao.com
 2025.09.15 (월) 16:52
2025.09.15 (월) 16:52